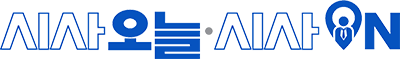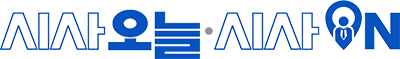[시사오늘·시사ON·시사온=김웅식 논설위원)

식당에서 즐겨 구워 먹는 갈매기살은 날짐승 갈매기의 고기가 아닙니다. 그것은 바로 돼지의 횡격막을 이루고 있는 살을 말합니다. 그것을 갈매기살이라 일컫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.
원래 형태는 ‘가로막+살’이었는데, 먼저 두 낱말의 경계에 ‘이’가 첨가돼 ‘가로막이+살’이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첨가된 ‘이’가 앞의 ‘아’에 영향을 미쳐 ‘가로맥이살’→ ‘가로매기살’이 된 것이죠. 마지막으로 ‘가로’의 ‘오’가 탈락해 갈매기살이 된 것입니다. 낱말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‘갈매기’라는 형태가 나온 것이지, 원래 날짐승 갈매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주례 없이 예식을 치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. 그 음식 대접을 흔히 피로연이라 합니다. 그런데 그 피로연을 ‘하객들이 식에 참석하느라고 피로했을 테니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벌이는 연회’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.
그러나 피로연은 ‘披露宴’이라는 한자에서 비롯된 낱말로, 나른함을 뜻하는 피로(疲勞)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피로(披=알리다, 露=드러내다)는 ‘널리 알림’을 뜻하죠. 다시 말하면 혼인이나 출생, 출판기념회와 같이 좋은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베푸는 연회를 피로연이라 하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‘출판 기념회 피로연을 베풀다’라는 말도 가능합니다.
이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 틀릴 수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. ‘바지가 몸에 딱 맞다.’ ‘자기 말만 맞다고 한다.’ 이 예문들은 흔히 쓰는 표현인데,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. 국어사전에 따르면 ‘맞다’는 동사입니다. 따라서 앞의 문장은 ‘바지가 몸에 딱 맞는다.’ ‘자기 말만 맞는다고 한다.’로 써야 합니다.
대중은 ‘맞는다고 한다’보다는 ‘맞다고 한다’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. 마치 ‘맞다’를 형용사처럼 쓰는 것이죠. 동사, 형용사는 그 성질이 종종 변하기도 해서 어느 한 품사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생깁니다. ‘맞다’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현재로서는 ‘바지가 몸에 딱 맞다’ ‘자기 말만 맞다고 한다’가 잘못된 표현이지만, 앞으로 이런 예들은 새롭게 기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
*참고: 허철구 <공부도 인생도 국어에 답이 있다>, 리의도 <올바른 우리말 사용법>

좌우명 : 안 되면 되게 하라.